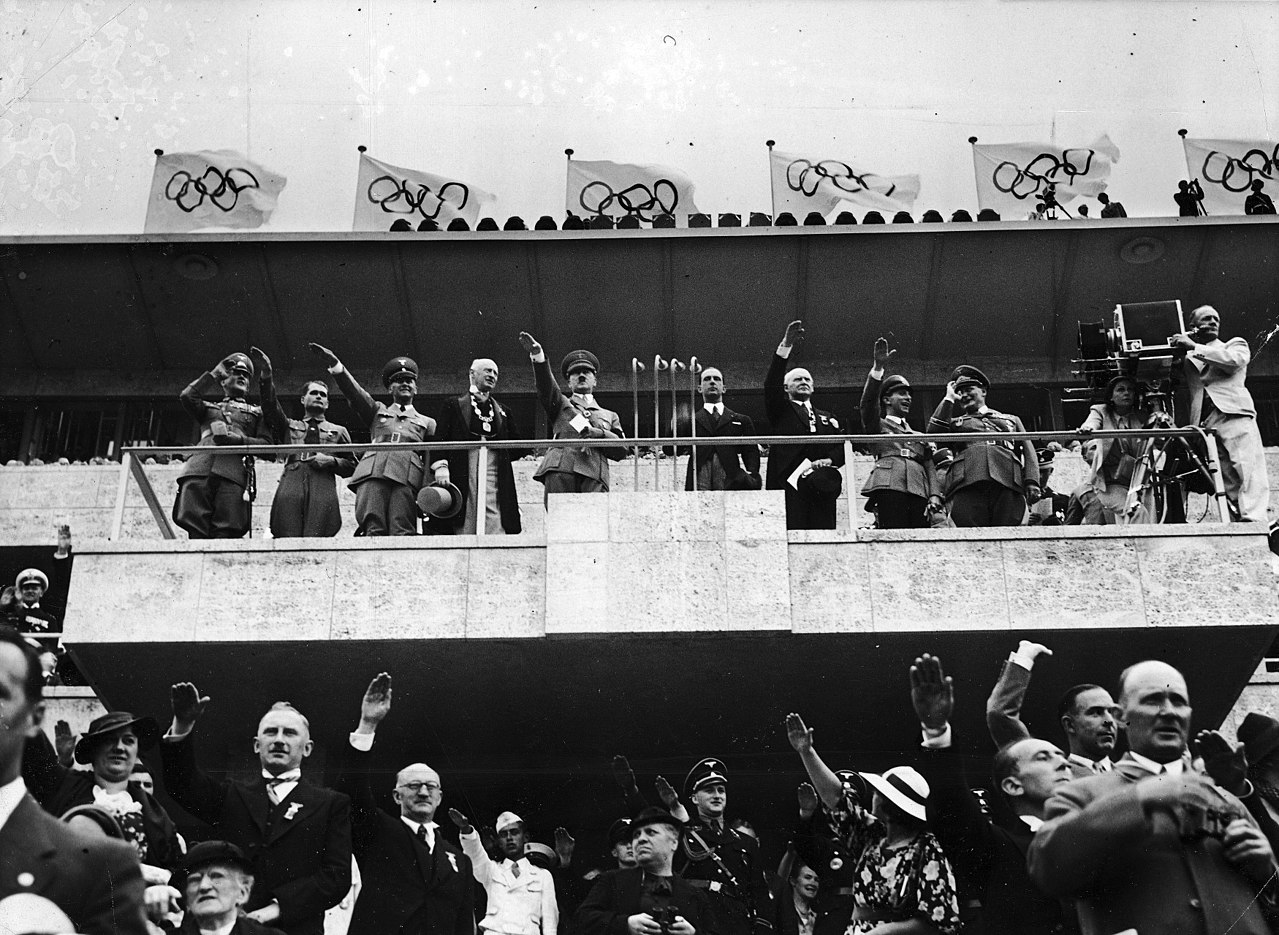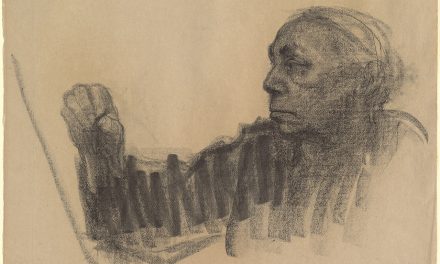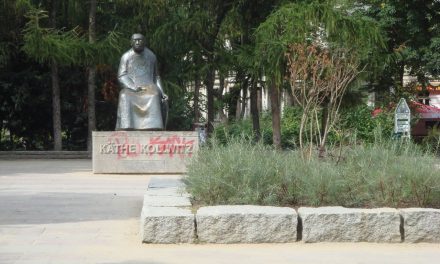세계 친절의 날을 맞아
세계 친절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11월 13일. 세계 친절의 날을 맞아 베를린 언론계가 다같이 허허 웃는다. 풍자적, 자조적인 기사가 여기저기 실렸다. 이유인즉, 베를린 사람들이 대체로 퉁명스럽거나 다소 냉소적이기 때문이다.
오늘, ‘세계 친절의 날’을 맞아 단 하루만이라도 말좀 예쁘게 하자, 좀 친절하자!라는 요지의 글이 많았다.
오죽하면 베를린 말씨를 “주둥이질Berliner Schnauze”이라고 할까. 직역하자면 베를린 사람들의 주둥이쯤 된다. 베를린 사투리가 없지는 않다.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고 단어 말미에 ‘스가 나오면 이를 ’트‘로, ’흐‘는 ’크‘로발음하기 때문에 거칠게 들린다. 예를 들어 다스das를 다트dat로 발음하거나 이히ich를 이크ick로 발음하는 식이다. 그런데 베를린에 워낙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 원래 베를린 억양에 다른 여러 사투리가 섞이고 근본을 알 수 없는 말까지 녹아들어 이제는 베를린 말을 “도시권 언어Metrolekt”라 정의하게끔 되었다.
좋게 보자면 직선적이고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게 말하면?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투가 투박하고 퉁명스럽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속내도 투박하고 퉁명스러운가?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걸까?
베를린에는 베를린 토박이들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인파에 밀려 어딘가 구석에 박혀있는 듯하다. 우선 현재 외국인 비율이 24.4%인 데다가 독일인 중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올라 온 사람들이 많다. 그에 더해 연간 천이백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관광객들이 인파에 섞인다. 베를린 총인구가 3백8십만 명이니, 관광객의 수가 세 배가 넘는다. 관광객들이 모두 여행 가방을 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에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인파 속에서 베를린 토박이를 알아보기는 정말 어렵다. 그 유명한 주둥이를 열어야 비로소 식별이 된다.
요즘은 지하절, 전철, 버스나 거리에서도 거의 외국어만 들려온다. 영어도 이젠 묻힌 편이고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도 자주 듣는데 그외 아랍어, 우크라이나어, 시리아어도 분명 섞여 있겠으나 알아듣지 못하니 그저 바벨탑이다. 독일 사람들, 베를린 토박이들은 주눅이 들었는지 공공장소에선 ‘주둥이’를 닫고 있다.
돌이켜 보니 학창 시절 알바를 하면서 베를린 토박이들과 꽤 자주 접촉한 것 같다. 카페테리아 직원, 양로원 간호사, 환경미화원, 그리고 나중에 조경 시공업체 직원, 정원사 중 상당수가 서민층에 속했고 이들은 거침없이 베를린말을 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두 여인이 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기숙사 ‘환경미화원’ 할머니셨다. 빌케 여사. 이름도 잊지 않는다. 처음에 말도 서툴고 독일 기숙사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아 할머니의 매서운 눈총을 여러 번 받았다. 높은 연세에 깡마르고 얼굴엔 주름이 자글거렸지만 동작은 민첩했다. 공동 주방에서 멸칫국물을 내기라도 하면(그때 수제비를 자주 끓여 먹었다.) 바로 날아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째려 보셨다. 그 모습이 동화속 마귀할머니와 어찌나 닮았던지. 할머니의 욕설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 것이 불행중 다행이었다. 그때 어떤 지적들을 받았는지 아직도 모른다.
그 기숙사에서 3년을 살았는데 나중엔 친해졌고 친해지다 보니 정이 들었다. 어느 봄날 기숙사 뜰에 자라는 씀바귀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나물을 해 먹으려 뜯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다가와서 “아 우리도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잡초 뜯어 먹었어요.” 했다. 우리의 나물 식문화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내 독일어가 너무 짧아서 그냥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도 이따금 전화도 주시고 은퇴한다며 찾아오시기도 했다. 알고 보니 마음이 한없이 깊고 푸근한 여인이었다.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정이 뚝뚝 떨어졌던 그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
다음으로 생각나는 여인은 백화점 카페테리아에서 알바할 때 내 상사였던 슈미트 여사다. 위의 빌케 여사와 나이는 비슷했지만 여러모로 대조적이었다. 크고 뚱뚱했는데 피부가 팽팽하여 얼굴이 늘 복숭아 같았다. 우리 둘이 모든 것을 꾸려갔기에 일은 많았지만 거기서 일한 몇 주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슈미트 여사 역시 첨엔 툭툭 내뱉는 베를린 말본새로 갑질을 해댔는데, 며칠 지나자 살아온 이야기를 푸념하듯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넋두리는 내 알바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어 기숙사로 몇 번 전화하셨다. 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그때가 80년대였으니 기숙사 방에 개인 전화는 없고 휴대폰은 아직 발명되기도 전이었다. 공동 주방 앞 복도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리로 전화하셨다. 빌케 여사가 얼굴이 비치도록 반들반들 닦아 놓은 복도에 서서 한 시간쯤 이어지는 슈미트 여사의 취기 어린 횡설수설을 들어 주었다. 오죽 외로웠으면 내게 전화를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두 여인 다 전쟁을 겪은 세대에 속해서 상흔이 깊이 남아 있던 것 같다.
물론 베를린 주둥이질이 전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서민들은 처음 서먹함을 극복하고 나면 곧 구수해 지지만 눈빛이 칼같고 신랄한 말을 서슴지 않는 교양 지식층은 베를린 주둥이질을 열렬히 지킨다. 물론 지식층답게 따박따박 표준말을 쓰지만 다소의 빈정거림과 강렬한 사회비판이 섞인 화법이야말로 베를린 주둥이질의 정수이다. 오죽했으면 괴테가 이미 “베를린에 가면 조심해야 해. 쌈쟁이들에다가 거칠어서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니까.” 이랬을까.
만약에 베를린 사람들이 상냥해진다면? 물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친절해졌는데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니 베를린 사람들이 상냥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토박이는 아니지만 이들도 베를린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들 덕분에 베를린이 평균적으로 상냥해진 건 사실이다.
겉은 거칠지만 속은 푸근하고, 거짓이 없고, 등 뒤에서 칼 꽂지 않는 사람들. ‘한 번만 마음 주면 영원히 변치 않는’ 베를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베를린 주둥이질이 사라지면 아쉬울 것 같다.
해마다 11월 13일에 세계 친절의 날을 맞아 하루만 싹싹하면 족하지 않을까?
JHG
© 3.SPACE MAGAZINE / 고정희 컬럼 / 베를린톡